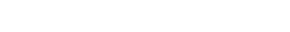정전 70주년 ‘DMZ OPEN 페스티벌’
전장의 중심에서 희망을 외치다
한 해 동안 연천에서 김포까지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평화와 희망의 몸짓,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55‘, ’64’. 두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다. 80~90년대에 뜨거운 청춘을 보낸 이들에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심장이 요동치고 가슴엔 왠지 모를 분노가 불길처럼 차오를지도 모른다. 풀어야 할 숙제지만 언제 풀게 될지 모를 숫자 155. 그 의미는 강원도 간성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은 휴전의 경계선, 즉 휴전선 155마일(약 248km)이다. 64는 155마일의 휴전선 중 경기도에 속해 있는 휴전선의 길이인 64마일(103km)을 말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을 발발했다. 그리고 1953년 7월 전쟁은 그쳤다. 정확하게는 멈춘 것일 뿐 그친 건 아니다. 멈춘 것도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미국, 중국, 북한의 수뇌부에 의해 ‘종전’이 아닌 ‘휴전협전(armistice agreement)’을 맺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은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나무의 꼭대기처럼,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싸늘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막아선다. 산야의 높은 지대를 따라 애벌레처럼 늘어선 녹슨 철책선과 그 틈틈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최전방 초소들, 그리고 가물가물 은폐를 거듭하는 남북 병사들. 언뜻 보기엔 이데올로기도 없고, 전쟁도 없다. 정적만이 감돌 뿐이다. 아무도 여기를 전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정적을 평화라고 말하는 이도 없다. 우리는 정적 뒤에 또아리를 튼 대립과 갈등의 칼날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23년이 되었다.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휴전선도 그대로고, 이를 지키는 군인들도 사라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지 않은 탓에 원시의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었다. 무엇보다 전장의 상징과도 같은 DMZ(비무장지대)는 생명의 땅이었으며, 희망과 평화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준 것이 ‘DMZ OPEN 페스티벌’이다.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비무장지대를 음악과 미술을 통해 표현했고, 마라톤 참가자들은 비무장지대를 달리며 온몸으로 느꼈다. 학자들은 포럼을 열어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설득했다. 대중가요 가수들도 동참을 꺼리지 않았다. 경쾌하고 밝은 노래를 통해 자유를 상기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주저 없이 외쳤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땅과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은 더없이 평화롭다.”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을 잊지 말자”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연천에서 김포까지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평화와 희망의 몸짓,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정전 70주년 DMZ OPEN 페스티벌은 막을 내렸다. 그래도 사람들은 방문할 것이다. 행사가 열렸던 지역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무겁고, 어둡고,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전장을 희망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풍경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觀, 자세히 바라보다), 간(看, 자세히 관찰하다), 견(見, 생각해 보다) 하도록 하자.